한전 근무하시잖아요!
정수봉 경기본부 배전운영부 차장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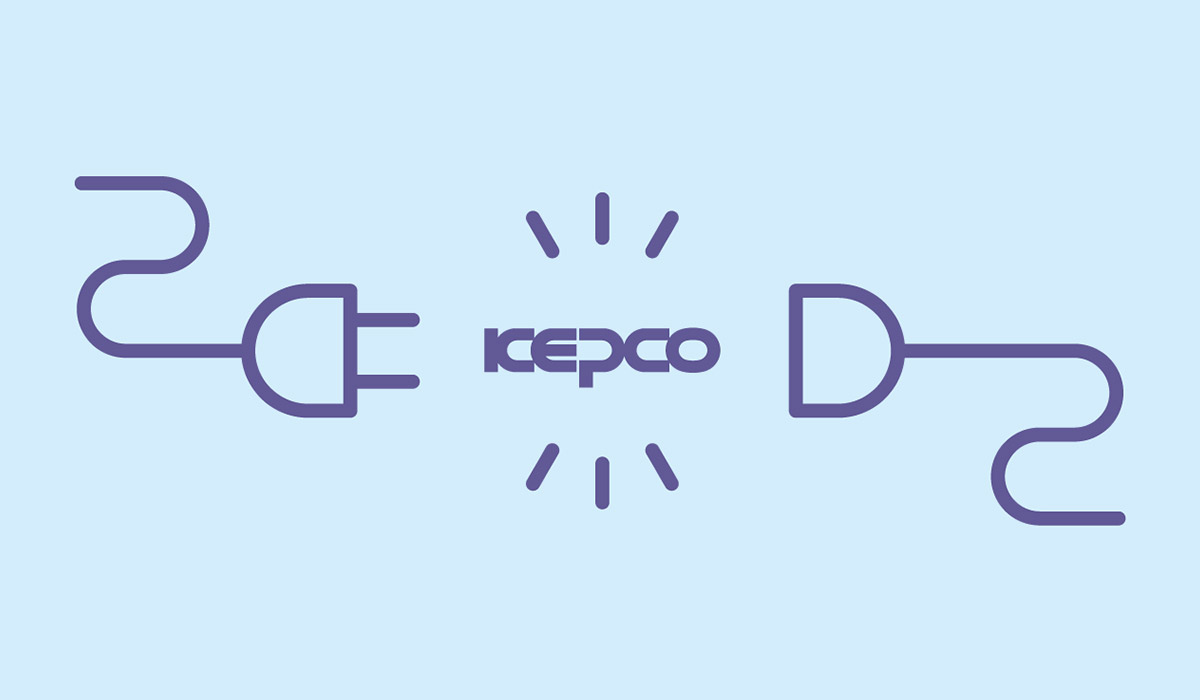
모두가 인정하던
‘한전 직원’ 시절
지금이야 ‘한전’이 아니라 ‘반전’쯤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지만 예전에 내가 몸담고 있던 ‘한전’의 위세는 대단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의 외상거래는 기본이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공무원들이나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소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당당하게 일합을 겨룰 수 있을 정도였다. 어디 그뿐이랴.
지인들을 만나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다’라는 말이라도 하게 되면 ‘한전 근무하시잖아요’라는 말을 듣곤 했다. ‘한전 직원’이니까 벌이도 괜찮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이지 당신들은 괜찮지 않느냐는 믿음이 있는 말이었다.
비록 한참 전의 일들이었지만 가끔 공사현장에 장비실사나 품셈실사, 사용 전 점검이라도 나가게 되면 업체의 고위직들이 긴장을 하면서 융숭히(?) 맞이하는 일들도 자주 있곤 했다.
이를 테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온전히 ‘갑’을 향유하던 ‘한전 직원’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한전이라는 이름,
자신을 발전시켰던 계기
‘한전’이라는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권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기에 그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도 덩달아 높았다.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또한 상대적으로
커졌었다. 더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기 버겁더라도 억울해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그 벽을 넘어야만 했다. 현실의 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이 그것도 몰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부지런히 규정집을 봤다. 민원 이력을 조회해 보고, 판례도 살펴보고, 신기술을 습득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한전 근무하시잖아요’. 이 짧은 말의 정체는 내가 무심히 지나쳐버린 ‘우리 사회가 정한 사회 통념에 대한 기준’,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변에 ‘한전
직원’다운 도덕적·인격적·경제적 기준을 돌아보도록 일깨워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도덕성의 부족, 인격적인 결함, 경제적 궁핍 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전
근무하시잖아요’라는 말의 족쇄가 되어 스스로가 행동하는 기저에 부지불식간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올해 9월 말이면 퇴직을 하게 되니, 이제 그 말을 듣게 될 시간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며 그리워하게 될까? 아니지, 그
때가 되면 이런 말을 듣겠구나.
“한전 근무하셨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