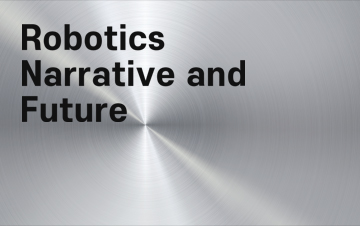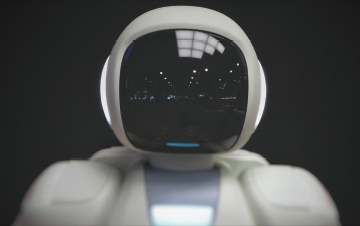2022 November
지난호 보기
vol. 593
-->
키워드 사전
별점 다섯 개 : 나만 알고 싶은 멋진 것
‘영화 별점’이
관객을 해방시킨다
관객을 해방시킨다
일상 대부분은 별점으로 이뤄져 있다. 책, 공연, 호텔, 음식점, 어플, 관광명소,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별점을 매기니 현대 사회에 별점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없어 보인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별점 시스템을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건 영화다. 영화를 보기 전엔 평론가의 별점에 따라 작품 소비가 달라지고, 영화를 보고 나선 각자의 별점을 공유한다. 시나브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게 된 별점. 사람들은 별점 사회에 수동적으로 갇혀있기만 할까?
글 이자연(대중문화평론가, 씨네21 기자)

별점에게 물어봐
최초의 순간으로 먼저 돌아가 보자. 때는 1928년. <뉴욕 데일리 뉴스>의 영화 평론가 아이린 티러(Irene Thirer)는 작품을 두고 별 0개에서 3개까지 그 등급을 매겼는데, 언론사에서 지금의 별점과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티러에 의하면 별 3개는 ‘우수’, 2개는 ‘좋음’, 1개는 ‘보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 눈에 작품 평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왔지만 그럼에도 기준 없는 별점 시스템이 여전히 낯설었는지 이를 채택한 신문사는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흘러 1969년, 미국의 영화 평론가이자 프로듀서인 레너드 말틴(Leonard Maltin)이 <레너드 말틴의 영화 비디오 가이드북>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해당 잡지에 별점 평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
4개를 만점으로 두었고, 별점을 매기지 못할 정도로 작품이 별로인 경우 폭탄을 안겨주는 다소 엉뚱한 장치도 덧붙였다. 이러한 활동이 별점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큰 기여를 하면서 자연스레 별 반개라는 세밀한 옵션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평가 사이엔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별점의 편의성과 간명성, 오락성에 동의하긴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평론가마다 달랐던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 매겨지는지 비평적 합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누군가는 1점을 주면서도 희망을 던지고 또 누군가는 무가치한 작품으로 여겼다.
별 외에 또 다른 평가 방식을 제기한 이가 있으니 바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Roger Ebert)이다. 그는 비평가 진 시스켈(Gene Siskel)과 함께 TV 비평 프로그램 <At the Movies>에 출연하여 영화 평론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두 엄지를 내보이며 “Two thumbs up!”이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는데, 지금의 ‘좋아요’시스템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별 외에 또 다른 평가 방식을 제기한 이가 있으니 바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Roger Ebert)이다. 그는 비평가 진 시스켈(Gene Siskel)과 함께 TV 비평 프로그램 <At the Movies>에 출연하여 영화 평론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두 엄지를 내보이며 “Two thumbs up!”이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는데, 지금의 ‘좋아요’시스템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별점이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영화 별점이 정착하면 할수록 새로운 작품이 응당 거쳐야 할 필수코스로 떠올랐다. 별점은 곧 추천 사유이자 외면의 이유였다. 점차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전 평점에 맞춰 소비 여부를 결정했고, 평점과 관객 수는 대부분 비례 관계를 띄었다. 별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영화 기자, 평론가, 산업 관계자 등 전문가 영역에 해당했기에 평점 그 자체가 지성과 권위의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영화 리뷰 커뮤니티인 ‘로튼 토마토’는 웹사이트를 처음 신설했을 때 일반 유저보다 평론가의 리뷰를 메인으로 내세웠다.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작품성 낮은 연극에 토마토를 던지던 과거의 풍경을 차용한 것처럼, 썩은 토마토 중 신선도 높은 토마토(즉 영화)를 분별해내도록 도왔다. 한국의 대표 영화영상 전문지인 <씨네21>도 전문가
‘별점’과 네티즌 ‘리뷰’를 따로 두면서 평가할 수 있는 권위와 영화 감상을 나누는 자리를 따로 구별했다.
영화라는 어렵고 심도 깊은 세계는 일반인의 판단을 개입시킬 여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공고했던 세계도 조금씩 허물어져갔다. 바로 ‘왓챠피디아(구 왓챠)’가 생겨나면서부터다. 정확히 따지면 왓챠피디아는 비평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의 평점을 통해 내 취향을 가늠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추천받는 큐레이션 플랫폼에 가깝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할 것 같은 것. 왓챠피디아는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적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만의 별점을 매겨나가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비평적 사고 방식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된 것이다. 그 기준은 어렵고 난해한 이론이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나를 만족시켰는가, 나의 취향을 겨냥했는가 등 자기를 중심으로 둔 질문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영화라는 어렵고 심도 깊은 세계는 일반인의 판단을 개입시킬 여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공고했던 세계도 조금씩 허물어져갔다. 바로 ‘왓챠피디아(구 왓챠)’가 생겨나면서부터다. 정확히 따지면 왓챠피디아는 비평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의 평점을 통해 내 취향을 가늠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추천받는 큐레이션 플랫폼에 가깝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할 것 같은 것. 왓챠피디아는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적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기만의 별점을 매겨나가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비평적 사고 방식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된 것이다. 그 기준은 어렵고 난해한 이론이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나를 만족시켰는가, 나의 취향을 겨냥했는가 등 자기를 중심으로 둔 질문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미국의 영화 리뷰 커뮤니티 ‘로튼 토마토’의 ‘tomatometer’.
‘신선함(fresh)’ 평가가 60% 이상인 영화는 붉은 토마토, 그렇지 않은 건 녹색 토마토 등으로 표시된다.
‘신선함(fresh)’ 평가가 60% 이상인 영화는 붉은 토마토, 그렇지 않은 건 녹색 토마토 등으로 표시된다.
취향의 우주 속 별 하나 둘…
취향은 무수히 많은 요소를 융합시켜낸 결과물이다. 나의 개인사, 내가 살아가는 시대 배경, 사회 분위기, 가치관, 환상과 이상, 문화적 향유. 그러니 내 취향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행위는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요소를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판단해나가는 과정에 가깝다. 한 예로 올여름 <외계+인>, <한산>, <헌트>, <비상선언>이 여름 시장을 겨냥한 ‘텐트폴 BIG 4’로 치열한 대전을 벌일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관객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블록버스터 작품을 찬사하는 동안 비평가들이 신랄한 평가를 내놓았던 반면, 올해는 그와 180도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영화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고, 오히려 비평가들이 좋은 점을 설명한 것. 위축된 극장가를 위한 관대한 대변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관객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한 마디의 말로 일관된 태도를 고수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별로라니까?”
이러한 태도는 관객 스스로를 조금씩 해방시켰다. <헤어질 결심>이 초반 성적이 예측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영화 홍보에 박차를 가한 건 다름 아닌 관객이었다. 영화의 주옥같은 포인트를 별점평으로 매겨 SNS에 공유했고, 같은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한산> 별점평에도 <헤어질 결심>의 명대사를 재치 있게 인용하여 하나의 밈으로 만들었다. 전문성을 인정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듯한 별점이 온라인 놀이문화로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주도적 평가와 판단을 내세우며 타인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관객은 영화의 객체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논리를 펼쳐나가며 고차원적인 영화 감상 문화를 형성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상 중심엔 과거에 관객을 은연중 배제했던 별점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관객 스스로를 조금씩 해방시켰다. <헤어질 결심>이 초반 성적이 예측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영화 홍보에 박차를 가한 건 다름 아닌 관객이었다. 영화의 주옥같은 포인트를 별점평으로 매겨 SNS에 공유했고, 같은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한산> 별점평에도 <헤어질 결심>의 명대사를 재치 있게 인용하여 하나의 밈으로 만들었다. 전문성을 인정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듯한 별점이 온라인 놀이문화로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주도적 평가와 판단을 내세우며 타인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관객은 영화의 객체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논리를 펼쳐나가며 고차원적인 영화 감상 문화를 형성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상 중심엔 과거에 관객을 은연중 배제했던 별점이 있다.
관련 컨텐츠